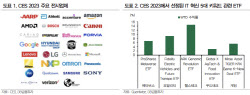|
이승훈(사진)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전시회에 비해 국내 전시회가 흥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러고는 20여 년 경력의 전시회사 대표이자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 “업계 스스로 전문성과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는 쓴소리를 덧붙였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가 세계 각지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비결은 혁신적인 트렌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콘텐츠 경쟁력’에 있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전시회의 매력은 시중에 없는 신제품과 신기술을 미리 보고 사업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주제관, 신제품관, 관련 콘퍼런스·포럼 등 부대행사를 개발해 행사 자체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국내는 당장 수익에 쫓겨 이런 부분에 대한 선행 투자나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비즈니스 수단으로서 전시·박람회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바이어 간 비즈니스 매칭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봤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과 바이어가 서로 정확히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최자의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매칭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인포마, 리드 등 글로벌 주최자는 참여기업이 수천개, 바이어가 수십만인 행사에서도 정밀한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업계 현실을 반영해 이 부분의 R&D(연구개발) 지원을 늘리는 것도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시·박람회 개최로 얻는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의 파급효과 이른바 레거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재 통계청이 집계하는 전시산업 통계는 행사 규모와 개수, 업계 매출과 종업원 수 등 현황 파악에 그치고 있는 데다 추정 통계에 불과해 전시·박람회가 갖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지자체가 수십년째 전시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책의 근거가 될 만한 정확한 전수조사 통계가 없어 전시산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전시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을 위해 2015년 손톱 밑 가시를 뽑자며 없앤 전시사업 등록제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