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현장에선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큰 상황이다. 여전히 풀지 못한 왜곡된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중국인 관광객 숫자가 증가하는 만큼 저가 여행 상품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도 적잖은 여행사들이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저가 여행 상품을 판매하며, 손해분을 쇼핑 수수료 등으로 메우는 ‘돌려막기식’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여행사들이 정상가의 20% 수준에 불과한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중국인 단체를 받고 있다”며 “결국 손해를 수수료로 메우기 위해 여행객들을 쇼핑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 MZ세대는 자유 여행, 로컬 체험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여행 업계는 이러한 변화는 고사하고 여전히 과거의 경험, 패턴에만 갇혀 있다. 여행 만족도는 물론 국가 이미지를 갉아먹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자기변명만 늘어놓은 채 저가 여행 상품을 팔고 있다.
정부도 저가 여행 상품 근절을 여러 차례 천명했지만, 현실은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상품 판매를 처벌하거나 영업 활동을 규제할 법적 근거도 없거니와 강매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않는 이상 단속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비자 입국 허용이 업계 내 출혈 경쟁을 부추겨 저질 방한 여행 상품만 늘리고, 불법체류 등 더 큰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숫자에 매몰된 ‘묻지마 유치’가 아닌 관광·여행산업 전반의 구조 혁신이다. 저질 상품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일정 내 쇼핑 근절 방안, 관광 가이드 자격 기준 강화, 지역과 연계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다변화를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중산층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동남아 시장 공략에 지금보다 더 주목하고 공을 들여야 한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무비자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올 1분기에만 10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중국인 관광객의 귀환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옛 성과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을 단순히 방한 수요 늘리기가 아닌 관광산업 전반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더 이상 ‘중국몽’에만 사로잡혀 한국 관광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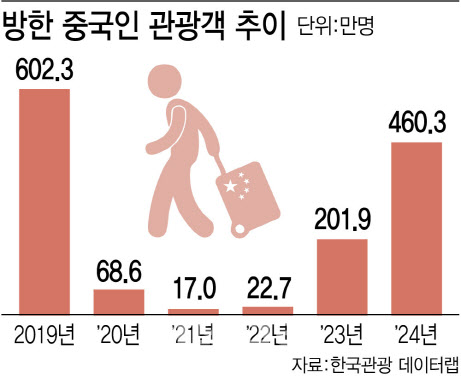




!['36.8억' 박재범이 부모님과 사는 강남 아파트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50006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