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74) 전 의원은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웰다잉 문화 확산이 필요한 이유를 이같이 말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며 은퇴 후 20~30년을 더 살아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원 대표는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시스템과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확립하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인 ‘웰다잉(well-dying)’이 필요하다”강조했다.
|
이 법은 웰다잉 문화 확산에 기여했지만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요 문제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 저조, 전산 시스템 연동 부족, 인공영양급식 중단 불가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의료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한다. 원 대표는 “법 적용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왜곡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향서 작성만으로 임종 직전 과도한 의료제정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유언장 작성은 막대한 사회적 분쟁비용을 덜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면서 일본의 간소화된 유언장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준비 없는 죽음은 모든 것을 의사의 결정, 장례업자들의 결정, 판사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임종이 다다른 순간에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 혈액검사 등을 받겠으며 값싼 장례 비용, 자녀의 상속분쟁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이 2014년 771건에서 2023년 2945건으로 10년 새 3.8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간 최소 상속분을 나누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민사소송) 역시 2023년 2035건 접수돼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속 분쟁 중 발생하는 가족 간의 민사소송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5만여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소송비용을 1인당 500만원씩으로 감안해도 1년에 5000억원 이상이 상속소송에 사용되는 것이다.
|
지난해 웰다잉, 웰에이징에 초점을 맞춘 ‘마지막 이기적 결정’이라는 책을 낸 그는 “내 삶의 마무리를 내가 결정하는 게 ‘마지막 이기적 결정”이라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죽음에 대한 침묵을 깨고 모두가 존엄한 삶과 죽음을 맞아 나에게 좋은 게 가족과 사회에도 기여하는 거라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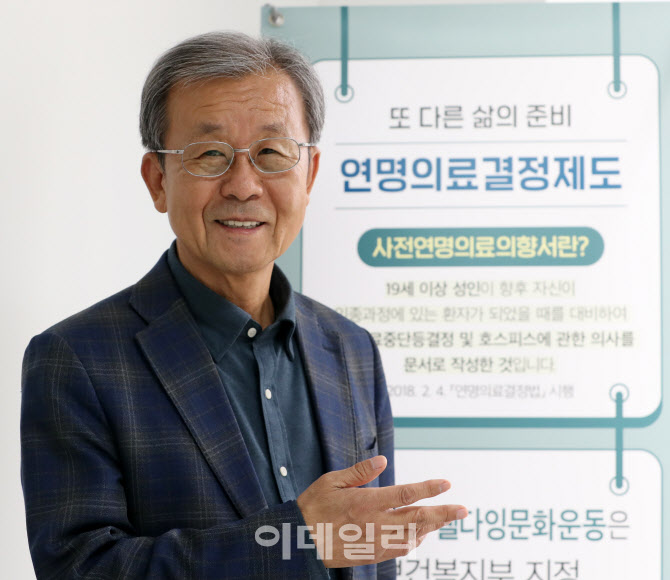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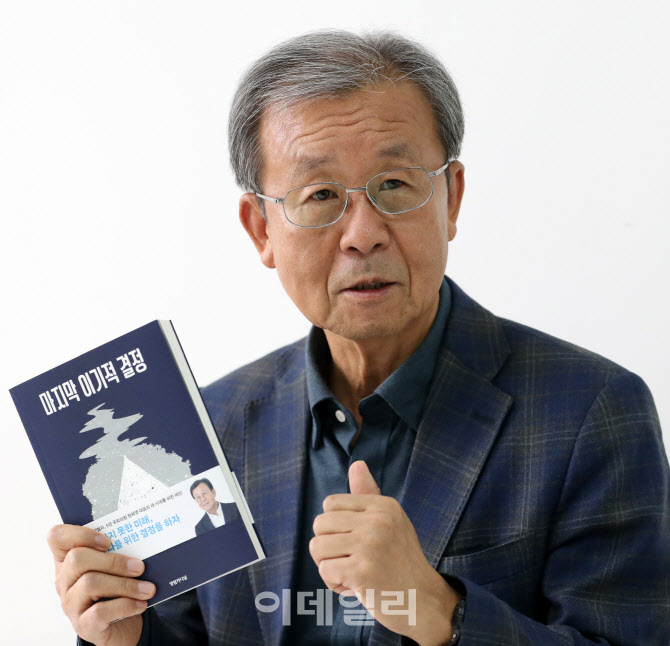





![“명품인 줄” 이부진, 아들 졸업식서 든 가방…어디 거지?[누구템]](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2/PS26021100594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