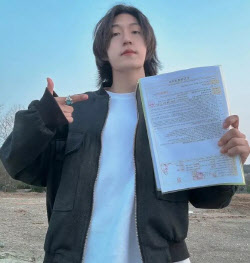|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건설업자가 사업 이권을 위해 각계 고위층을 상대로 향응을 제공한 `별장 성접대 사건`.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성접대 동영상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제의 장면 속 인물이 법조계 고위층이란 의혹이 일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번졌다. 장본인은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학의(사법연수원 14기) 당시 대전고검장.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실명까지 공개된 그는 취임 엿새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란 말을 남겼지만, 누리꾼에게 `별장난교`란 오명을 썼다.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경찰은 2013년 7월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고 발표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동영상 속 얼굴 및 목소리 등 과학적 성분 분석이 근거였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에게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등 증거 부족이 이유였다. 이듬해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김 전 차관을 직접 고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애써 모른 체 했다.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내놓은 중간수사 결과로 불똥은 경찰로 튀었다. 당시 핵심 인물들에게서 확보한 디지털 증거 3만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경찰의 부실 내지 축소·은폐 수사가 김 전 차관의 면죄부로 이어졌을 수 있단 얘기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펄쩍 뛰고 있다. 그럴 이유가 없고 검사 지휘를 받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선배인 김 전 차관을 감쌌다는 의혹에서 검찰이 자유로울 순 없다. 자료 비협조로 빈축을 사고 공정성 시비까지 일어 조사팀까지 교체된 터에 6년이 지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은 볼썽사납다. 증거 누락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최소한 공범이기 때문이다. 조사단 입을 빌어 증거 누락 운운하는 것은 두 차례나 사건을 뭉갠 검찰의 비겁한 변명으로 들린다.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친구 남친에 강제 키스한 女에 '일침'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1700002t.jpg)